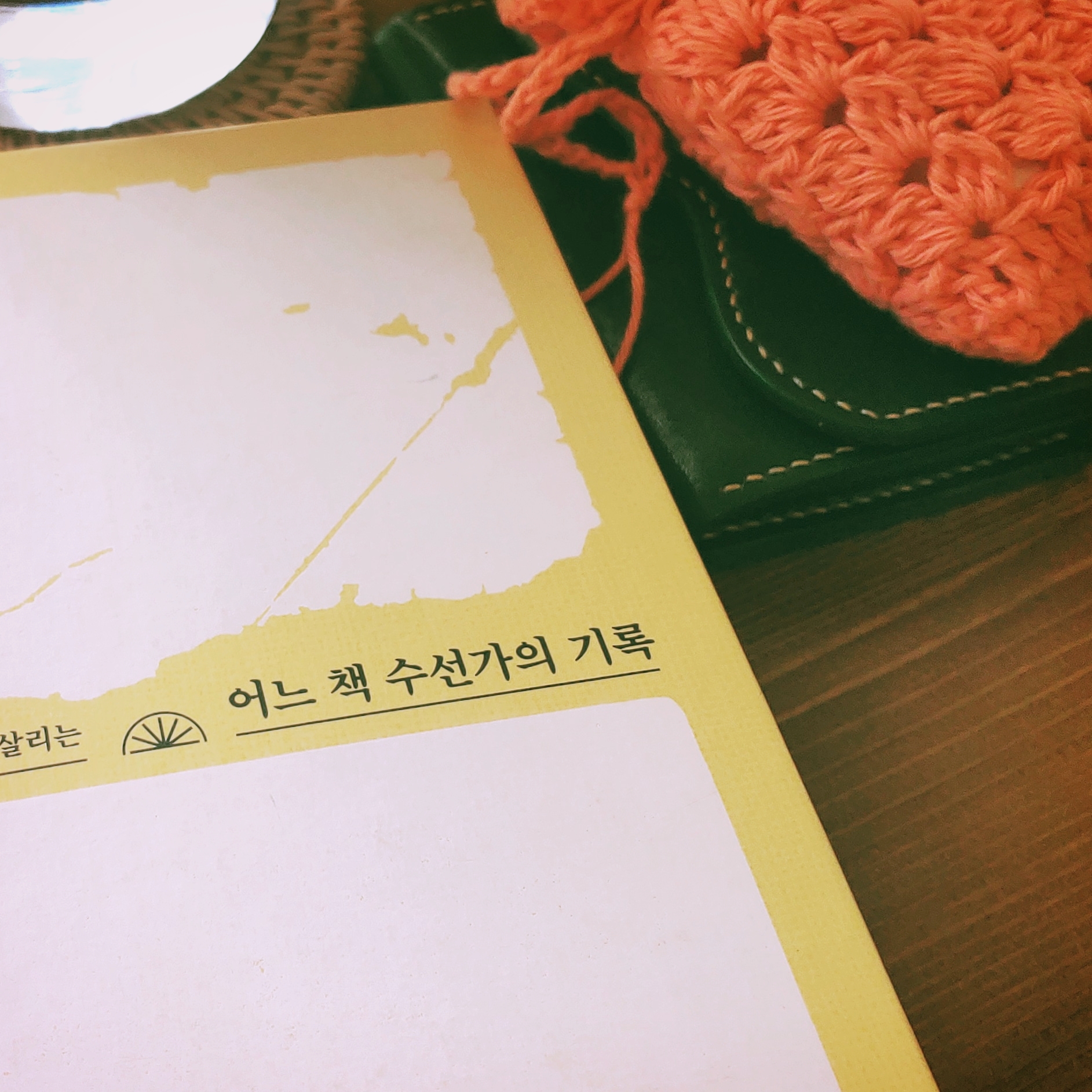
책 수선가. 말만 들어도 어딘지 모르게 따뜻해지는 저 단어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 종이를 다루는 일이기에 '수리'보다는 '수선'이 어울릴 것 같았다는 말에서 필자의 섬세함이 한껏 느껴진다.
작가는 말 그대로 세월이 묻어 파손된 책들을 수선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다. 자주 읽은 책, 자주 손에 닿았던 책일 수록 본래의 형태를 잃어버리기 쉽다. 그런 맥락에서 작가는 파손을 어떤 사랑의 증거로 여긴다. 어떤 순간 언제든 책을 펼치고 넘기고 사랑하여 필연적으로 닳을 수 밖에 없었던 것.
[ 책이 망가졌다고 해서 그 책과의 추억까지 흠집이 나는 건 아니다. 그건 그 오랜 시간을 책과 주인이 함께 견뎌온 우정이라고, 그건 정말이지 또 다른 사랑이라고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 ] - p.36
비슷한 맥락에서 안전하게 오래 살아남는 책은 '읽히지 않는 책'이라 말하는 부분이 꽤 인상적이었다. 어쩌면 이것을 삶에도 대입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누군가 내게 남긴 상처 역시 결국 그 사람이 내게 깊이 머물렀다는 흔적이 아닐까 하고. 긁히고 패이는 것은 마찰이 있어야 가능하다. 마찰이 있을만큼 가까워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희한하게도 이 책을 읽던 시점에 그 사실이 묘하게 위안이 되었다. 그렇게 여기면 어쩐지 오래 전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져 괴로웠던 날들까지 추억으로 끌어안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것 역시 어쩌면 내가 내 삶을 열렬히 사랑했던 흔적들일지 모르니까.
[ 찢어지고 더러워지고 망가졌던 부분들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고 반듯한 표지를 새로 입히는 것에서만 그치는 책 수선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더하고 이야기해보는 것. 책 수선가로서 욕심이 나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 한번쯤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 - p.265
필자는 자신은 책을 복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선'하는 사람이라 말한다. 책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나, 그간의 세월을 새로운 형태 속에 담는 것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말의 온기가 좋았다. 책이 그런식으로 '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어쩐지 필자가 자신의 일과 삶을 대하는 태도를 알 것 같았다고 해야할까. 새해에 접어들며 이런 저런 생각이 많던 차에 나에겐 여러모로 도움이 된 글이었다. 지나간 시간들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지게 만드는 글. 혹시 번잡한 고민에 휩싸인 누군가가 있다면 꼭 추천해주고 싶다. 필자가 가진 성실한 애정, 그리고 필자에게 수선을 의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흙먼지 날리던 마음을 잔잔히 가라앉혀줄테니까.
문득 책장을 돌아본다. 나는 다독가는 아니지만 책을 좋아하는 편이고, 오래 곁에 둔 책들도 여럿 있다. 사랑하는 것들. 더 자주 들여다보고 열어보아 언젠가 중심이 흐트러지거나 종이의 이음새가 약해질 것들. 언젠가 그런 책들을 수선하는 날이 온다면 어떨까. 나의 책들은 어떤 형태로 진화하게 될까. 다가올 우리의 시간이 궁금하다.
'BOOK REVIEW'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도서리뷰] 고마운 마음 - 델핀 드 비강 (0) | 2022.05.19 |
|---|

댓글